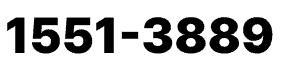법안,법률 [판결]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든 뒤 사망한 母子… 전남편과 친정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페이지 정보

본문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을 든 뒤 엄마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또는 차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석하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전남편뿐 아니라 사망한 엄마의 친정부모까지 모두 보험수익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306048)에서 A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월 20일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05년 9월 베트남 여성인 B 씨와 혼인하고 2006년 9월 B 씨와 사이에 아들 C 씨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 6월 협의이혼했다. 2018년 B 씨는 사망 시 C 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5000만 원짜리 상해사망보험을 들었다.
이후 B 씨는 2020년 1월 16일 D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6월 1일 이혼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6월 7일 B 씨와 C 씨 모자는 아파트에 침입한 D 씨에 의해 살해 당했다. D 씨는 흉기로 C 씨를 먼저 죽인 뒤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저질렀다. D 씨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도 저질렀는데, 수사 결과 C 씨는 화재 발생 전 먼저 사망하고 B 씨는 화재 발생 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모자가 사망한 뒤 A 씨는 "B 씨가 든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재판에선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또는 차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석해 A 씨와 참가인(B 씨의 부모)들을 모두 보험수익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조항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C 씨의 상속인인 A 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단계에선 B 씨의 베트남인 부모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이 B 씨의 상속인이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 씨에게 보험금 중 2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B 씨 부모에게 각각 보험금 중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여기에서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차순위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73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더 이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고, 그 전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시취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이미 사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자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시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위 때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상법의 이러한 규정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의 의사가 보험금이 보험수익자나 그의 유족의 생활보상에 충당되어질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아 보험수익자로 될 수 있는 근거를 상속관계에 두고 보험수익자의 흠결을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는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수익자 C 씨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B 씨 사망 전에 사망함에 따라 C 씨의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보험수익자가 되고(이때 B 씨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함), 그 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은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보험사고 발생(피보험자 B 씨 사망) 내지 보험계약자 사망(보험계약자 B 씨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는 A 씨와 참가인들"이라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 씨는 보험금 중 2분의 1에 대한 청구권, 참가인들은 B 씨에 대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중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을 각 취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며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 이전글[판결] 유치장 접견실에 휴대폰 밀반입… 의뢰인에게 건네준 변호사 집유 25.03.28
- 다음글[판결] 수습 해고 정당하려면…"구체적·실질적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야" 25.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