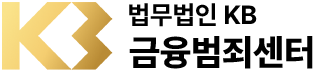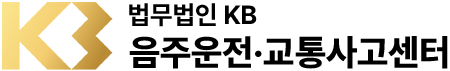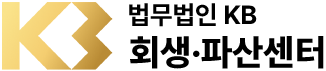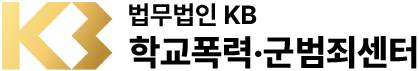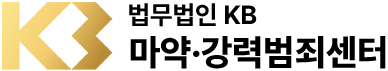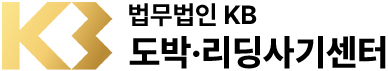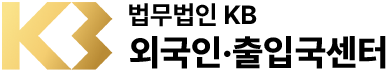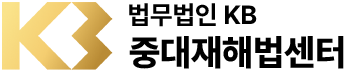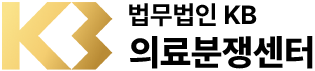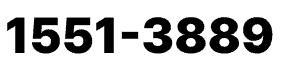[판결] 소멸시효 지난 빚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채무를 갚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유지돼 온 ‘시효 이익 포기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했는지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법리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7월 24일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의 포기인지가 쟁점이 된 A 씨의 배당이의 소(2023다24029)에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채무자 A 씨는 B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1·2차 차용금의 이자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에게 채무의 일부인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 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B 씨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A 씨는 “B 씨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았다”며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기존 대법원 판례(1966다2173 판결 등)는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채무를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법리를 유지할지를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
소멸시효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1·2차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법리를 58년 만에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기존 추정 법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채무 승인은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두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정 법리는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 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가 있다고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 표시를 손쉽게 추정하고 있어, 권리나 이익 포기에 관한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별개의견]
노태악(63·사법연수원 16기)·오석준(63·19기)·엄상필(57·23기)·이숙연(57·26기)·마용주(56·23기)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종전의 추정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원심 판결 중 제1, 2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판례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회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오히려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 여전히 법리적·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종전 판례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 반응]
윤진수(70·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그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례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도 과거에는 종전의 우리 대법원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이후 판례를 변경해 그러한 추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더라도 일단 채무를 승인하면 그 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에서는 일본과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판례의 무게가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더라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판례가 부당하다면 변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계정(53·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사건은 다른 사안에서도 추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하급심에 일깨우고 있다"며 "다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정은 무게감이 있고 정확하고 정합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해야 하고, 추정이 무게감이 있고 정확하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추정을 하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진(47·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가 일부 변제나 유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며 “종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이미 완성된 시효를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였기에 더 엄격해야 한다”며 “채권자가 ‘얻어걸린’ 상황으로 시효가 끝난 채무를 되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추심 업체들이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처럼 만들고 이후 갚으라고 몰아가는 등 악용 사례도 있었다”며 “30년 전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이어진 법리가 이번에 변경된 것은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