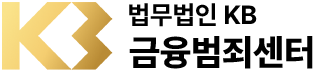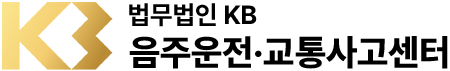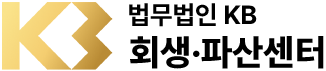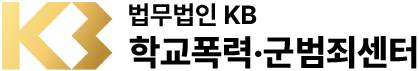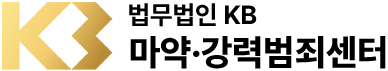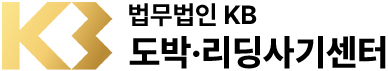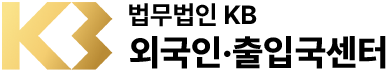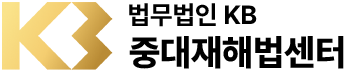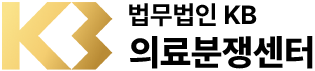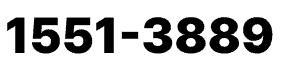[판결] "주거·생계 함께 해야 동일 세대"
페이지 정보

본문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각각 분양권을 청구했으나, 조합 측이 이들을 ‘1세대’로 묶어 주택 한 채만 분양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기재 여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거 및 생계 여부 등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가족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2022두504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3월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2019년 9월 원고 A 씨와 배우자 B씨는 A 씨를 대표조합원으로 하나의 분양 신청을 했다. A 씨의 동생 C 씨는 별도로 단독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C 씨가 A 씨 배우자인 B 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며 원고들 모두를 ‘1세대’로 봐 주택 1채만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미국에서, C 씨는 한국에서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 사이에 ‘1세대’, ‘하나의 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 등 실질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였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실질적 기준을 우선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은 형식적 기준을 중시하며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세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도시정비법령은 ‘세대’라는 개념의 정의나 포섭 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에서처럼 ‘1세대’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만약 (이 사건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라며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원고 B는 미국에, 원고 C는 대한민국에 각각 정주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어 원고 A, B와 원고 C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위 조항에 따른 ‘하나의 세대’로서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